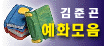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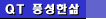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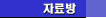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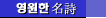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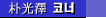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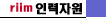
|
|
 1964년 입석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경자 간사님을 만났다. '아, 간사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에서 강용원 간사님을 만났다. 좀 까다롭게 보이는 가느스름한 눈이 인상적 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간사였던가? 간사 말고는 다른 일 에는 서투를 것 같은 사람 같았다. 대학 3학년 때 영문과 2학년이던 안순희 자매와 함께 C.C.C.편지 기자를 하면서 '동아출판사' 를 드나들며 강 간사 님을 도왔다. 그 분은 늘 꿈꾸는 자 같았다. 좀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 분이 쓰는 글을 좋아했다.
“강 군은 1964년부터 미국으로 건너 간 1971년 11월까지 C.C.C편지의 편집, 교정, 글쓰는 일까지 혼자서 도맡아 해 왔다. 그의 문체와 편집은 애독자들의 깊은 애정을 샀다. 그가 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C.C.C. 학생들 사이에서 팡세처럼 애독되 었다. 그의 정신계의 하늘이 키에르케고르의 코펜하겐의 하늘 | 우수와 고독으로 물들어 있어 그의 글은 나와 그가 듀엣으로 부른 신앙의 애정시 같은 것인지 모른다. 그와 나는 인생의 노래 곡조가 어딘지 슬프다. 한맺힌 한국인의 노래 가락에다 주님의 피를 묻힌다.” (김준곤 목사의 '강용원 간사를 생각한다.' 중에서)
그때 우리는 모두 가난했다. 학생들도 가난했지만 간사님들 도 가난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간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 각했다. 그 분은 가난만큼이나 절실하고 순수한 글을 썼다. 노총각이 되어서도 김 목사님만 따라 다닐 뿐 장가갈 생각은 안하는가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목사님께서 강간사님에게 정추자 자매를 중매했다. 너무나 순진한 그녀는 간사 아내의 삶이 얼마나 곤고할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과 결혼하여 두 개의 일을 뛰는 열심으로 아들 하나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몄다.
미국에 살면서도 햄버거는 안 먹는다는 순 한국 토종. CBS에 근무할 때도 한쪽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다는게 뭐 자랑인가. 지금이야 미국에도 한국 음식이 지천이지만 당시에는 드물었다. 1984년 어느 날, 그 분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사모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김치 서너 가지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 분의 입맛을 챙기는 사랑을 보였다.
외아들 재민이가 뜨거운 국을 먹으며 “아, 시원하다.” 하니 먹는 감을 안다고 좋아하던 강용원 간사님, 잘 나가는 직장,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던 CBS였는데 그만 모든 걸 다 접고 불혹도 넘은 나이에 다시 C.C.C. 간사의 삶으로 뛰어 들었다. 마치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강 간사님, 그 분이 키웠던 H.C.C.C. 지체들이 한국의 내로라 하는 인물들로 자랐으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실감난다.
이제 그 분은 '왕 간사'가 되어 세계의 심장인 뉴욕에서 이젠 회색빛이 도는 글을 쓰며, 자기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를 키우고 있다. 강 간사님도 아마 빈 둥우리 증후군을 앓을 거다. 그러나 간사님! 당신의 청춘은 아직도 눈부십니다
김영숙 · (주)칠성산업 두상달 대표이사 사모 yskim 118@hanmail.net
-예수프론트라인 : 강용원- |